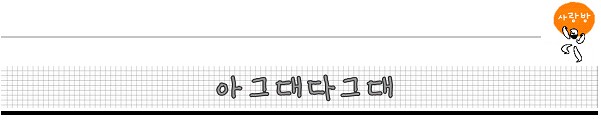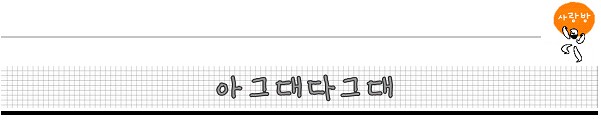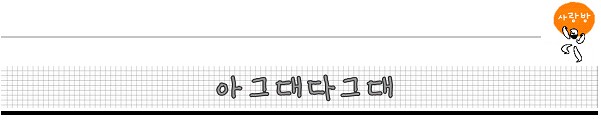
10월에는 ‘내 인생의 시’를 아그대다그대 이야기합니다.
 세주 세주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각나는 최초의 시...
비눗방울 날아라 바람타고 동동동
구름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비눗방울 날아라 지붕위에 동동동
하늘까지 올라라 둥실둥실 두둥실
이걸 반복해서 쓰면서 글씨 이쁘게쓰는 연습을 했었다..카카카카..
어디에 나오는 시일까요??? ^^
 ㅎㄹ ㅎㄹ
나그네 -박목월-
강가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사실 이 시를 좋아하거나 그런건 전혀...아니다;; 다만 수능시험 볼 때.
이 시가 나온 문제를 다 틀렸다. 어떻게 시를 느끼는 감성에 정답이 있는 건지. 내가 느낀 감성은 틀린 감성이란 말인가??
 ㅁ ㅁ
어디서 봤던 것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꽤 오래전엔 해마다 다이어리에 늘 적고 다녔던 시였다. 왜 그랬을가? 기억이 안난다. <북촌방향>과 <도가니>를 최근에 보고나서 든 생각이 ‘아, 인간은 참 찌질하고도 무섭다’였다 -_-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걸 자꾸 잊고 또 잃는 것에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 / 주제넘게 하느님을 분석하려 들지마라 / 인간의 올바른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 / 이 중간상태라는 좁은 지역에 놓인 우매하면서도 현명하고 / 무례하면서도 위대한 존재 / 회의가 쪽에서 보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진 / 금욕주의자의 긍지를 갖기엔 너무나도 연약한 / 인간은 중간에 매달려 행동할 것인가 쉴 것인가 회의하고 / 자기 자신을 신으로 혹은 짐승으로 여겨야 하는지 회의하고 / 자기의 정신을 혹은 육체를 더 좋아해야할지 회의한다 / 태어났지만 죽어야하고, 추리하지만 오류를 범한다 / 그의 이성이 그러하기에 / 너무 적게 생각하든 너무 많게 생각하든 무지한건 마찬가지 / 온통 혼란한 사상과 감정의 카오스 / 언제나 자기 자신에 속거나 깨닫는다 / 반은 일어나도록 반은 쓰러지도록 창조된 만물의 영정이면서도 만물의 먹이 / 진리의 유일한 심판자이면서 끝없는 오류에 던져져 있다 / 세계의 영광, 웃음거리, 그리고 수수께끼 (- 알렉산더 포프)
 미류 미류
시, 하면 먼저 생각나는 건 "지금 시집을 펼쳐 읽는 것은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이은하의 노래. ㅋ 그래서 시집을 펼칠 때마다 나는 읽기 위해 시를 읽고 있나 생각하기도 했던 듯. 한동안은 가방에 늘 시집 한 권씩은 넣고 다녔는데, 그건 읽기 위함이었을까? ㅎ 지금은 심보선 시인의 <눈 앞에 없는 사람>이라는 시집을 들고 다닌다.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읽고 있는데, 시인의 목소리를 아는 게 시를 읽을 때 또다른 느낌을 전해준다는 걸 깨닫고 있다. 시를 소개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 책 앞머리 '시인의 말'이 인상적이다. "시여, 너는 내게 단 한 번 물었는데 / 나는 네게 영원히 답하고 있구나."
 아해 아해
지금은 가끔 시도 읽고, 기회가 닿으면 시를 써볼 때도 있지만, 어렸을 적에는 시 같은 게 어디, 눈에 들어오나... 뛰어놀기 바쁜데... 그럴 때 나름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던 시가 있다.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다가 그립다"라는 동시였는데,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충격, 또 충격... 아니, 누구는 숙제로 동시 써오라면 고민고민해서 주절주절 써내야하는데, 이런 시는 장난도 아니고 대체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럼 대체 시란 뭘까?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다. 나름 감흥이 있었던 게지... 헤헤 최근에는 송경동 시인의 사소한물음에답함이라는 시집이 나태한 나에게 계속해서 긴장을 주고 있다. 그래도 나는 나태하지만.
 승은 승은
학교에서 강제로 외우라는 시말고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외운 최초의 시. 관계에서 나의 속도와 상대의 속도가 달랐을 때 상대방에게 이 시를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도 그때는 관계가 힘들면 시를 읽고 선물할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만 만지작 거린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_ 함민복
해안가 철책에 초병의 귀로 매달린 돌처럼 / 도둑의 침입을 경보하기 위한 장치인가 / 내 것과 내 것 아님의 경계를 나눈 자가 / 행인들에게 시위하는 완곡한 깃발인가 / 집의 안과 밖이 꽃의 향기를 흠향하려 / 건배하는 순간인가 눈물이 메말라 /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 꽃 철책이 시들고 /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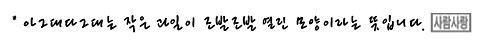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