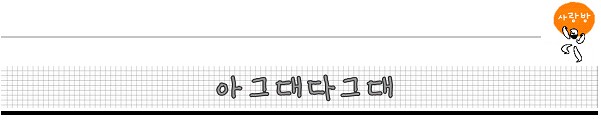
6월에는 “내 인생의 허풍”을 아그대다그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나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농담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거짓말은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허풍은 장난, 농담이나 거짓말과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든,
사랑방 활동을 열심히 하든,
땀흘리며 열심히 몸을 움직이든,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성취한 것을 과장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바다 앞에서 더 예쁜 조개껍질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 인생의 '허풍'이라구~!!
큭큭 >_<) (아해)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어느날 문득 내가 어렸을 때,
헬리콥터를 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무렵 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나 헬리콥터 타 봤다"
그리고 몇 년 후, 엄마한테 물었다.
"그때, 우리 헬리콥터 왜 탔어?"
"헬리콥터를 언제 탔다고 그라노?"
"..."
꿈이었을까? (시소)
 가끔 사랑방이나 경찰감시 활동에 대해
가끔 사랑방이나 경찰감시 활동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다.
그럴때면 안 그런 척
말을 아끼는 척 하면서
조금씩 허풍을 섞게게 된다.
나 대단한 일 해..
일반과 활동 사이의 간극을 줄여보겠다던
처음의 결심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다.
못말리는 자의식이여. (유성)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에나 울 엄마, 아빠의 걱정은 한결같다.
"보아하니 니가 돈도 못벌고
일은 엄청시리 하는 것 같은디, 전망은 있나?
우리 딸내미 잘 나가는 것 맞나?"
주로 어물쩡 넘어가지만,
약발이 약해진다 싶을 때가 되면 거침없이 허풍을 날려야 한다.
"이게 얼마나 전망이 밝은 일인대예."
벤처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벤처를 팔았고,
유엔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릴 때는 유엔을 팔았다.
어느 정도의 허풍은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ㅋ
(앗, 이거 울 엄마, 아빠 보시면 안되는데...) (개굴(경내))
 워낙 다른 사람이 '허풍'치는 게 '허풍'으로 그대로 보여서
워낙 다른 사람이 '허풍'치는 게 '허풍'으로 그대로 보여서
그런 건 잘 안하고 살았는데,
이리 저리 생각해보니 나도 늘 써먹는 허풍이 있네.
엄마가 결혼은 안할거냐고,
나이는 자꾸 먹는데 어쩔 거냐고
걱정이 태산 같으시면 이렇게 구라를 친다.
"걱정하지 마셔,
맘만 먹으면 한달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초화)
 허풍이라..
허풍이라..
나처럼 솔직담백한 인간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지..
이런이런, 알았소!
솔직담백 취소하고 '소심 건조~'로 바꿉니다.
그래도 굳이 찾으면,
'연애학 개론 쓰고도 남는다'고 떠벌인 대학 1,2학년시절의 허풍..
그것이네. (둥실둥실달)
 허풍,
허풍,
아무리 생각해도
나같이 진실하고 진지한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도 기억을 떠올리면,
초등학교 때 나에게 레이스가 많이 달린 잠옷이 있다고
친구들에게 뻥친 게 생각난다.
그 시절 레이스가 주렁주렁 달린 잠옷은
내 인생의 로망이었다.
최근에는
요가를 하면서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동안 느꼈던 것이
‘실재’인지 ‘뻥’이었는지 햇갈릴 때가 있는 것 같다.
그 느낌을 얘기한 것이
허풍같기도 하고 진짜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승은)
 리모콘이 꿈쩍 않고 작동 안 할 때,
리모콘이 꿈쩍 않고 작동 안 할 때,
리모콘을 딱딱치거나
그것도 안되면
뚜껑을 열고
나란히 누워 있는 건전지 두개를
뺑그르 돌리고 돌린다.
남아 있는 건전지 전력을 흔들어 깨워 쓰겠다는 속셈인데..
나에게 허풍은 그런거다.
살다 에너지가 소진됐다 싶으면
스스로 허풍으로 달랜다.
"일숙,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 멋대로 살았잖아. 걱정마 앞으로도 잘 살거야~"
또
'난 이래, 난 저래' 하면서.
내가 말하고도 내가 웃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겠나.
그저 잘 살아 보겠다고 위로하고 허풍치는 추임새이지.
그걸 누구는 최면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든.
씩씩하려며 적당히 '허풍쟁이'이어야 하고,
재미나게 살려면 적당히 '개구쟁이'이어야 한다.
인생이 바로 '연극'이니까. (일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