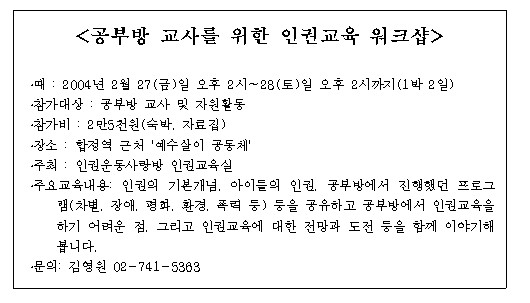먼저 지난 1년 동안 저는 참 행복한 편집장이었다는 고백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 여름부터 하루소식은 자원활동가들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박종식, 김명수, 양승훈, 김대홍, 임국현, 박석진, 시윤정, 그리고 이제는 상임활동가가 된 강성준. 이들 모두가 저의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인권운동의 경험이 다소 부족한 자원활동가들이 작성한 기사를 교정하고 편집하는 과정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덕분에 피부는 더 까칠해지고 흰머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누구는 저의 끽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이 배어 있고 전문성과 심층성까지 겸비한 기사들을 들고 오는 횟수가 늘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비명을 내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인권운동의 거름이며 앞으로 더욱 기름진 거름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9월 하루소식 1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책, <새벽을 깨우는 A4 한 장>을 만드는 과정도 제게는 큰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책에 실을 글들을 가려 뽑고 주제별로 분류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의 축적된 힘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고, 하루소식과 함께 청춘을 불태운 선배들의 노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가진 하루소식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바쁠 뿐, ‘운동하는 신문’, ‘깨어있는 신문’, ‘진보적 인권운동을 개척하는 신문’이 되기 위한 발걸음은 왜 그렇게 더디게 내디뎌지는지, 늘 무거운 짐을 진 채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언론이나 날로 늘어가는 인터넷 대안매체들 속에서 ‘인권’하루소식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나 하는 의문도 늘 따라붙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루소식을 지켜봐 온 한 독자가 10주년에 즈음해 보내 온 글도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는 하루소식이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며, 진보적 시각을 기사 곳곳에 담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날카롭지만 애정에 찬 쓴소리를 보내주었었지요. 가슴을 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비하면 사무실 소파에서 칼잠을 자며 버텨야 했던 숱한 밤들의 고역은 차라리 쉬운 일에 속했습니다.
“…'작은 신문 큰 소식', '신문에 안 나는 것 싣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판', '반인권의 세상에 인권의 꽃씨를 뿌리는 신문' 등 독자들이 인권하루소식에 붙여준 이름들은 그 모든 피로와 회의를 단번에 날려버릴 청량제가 되어주었다. 또 창간 당시나 지금이나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아나,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는" 모진 세상은 인권하루소식이 여전히 존재해야 할 까닭을 깨우쳐주고 있다.… 한 시대를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치는 '운동하는 신문',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의 참된 인간해방의 열망을 담아내는 '작은 신문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비판받고 주저 없이 진실을 말하겠다. 다시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가겠다.”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념사 중에서
아! 하루소식 편집을 끝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새벽에 자원활동가들이 다시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따라~♪♬” 음~. 음도 가사도 조금씩 틀리지만 아주 멋진 합창입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보았나 봅니다^^. 앞으로 하루소식을 만드는 시간들도 이런 행복이 담뿍 담겨있는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