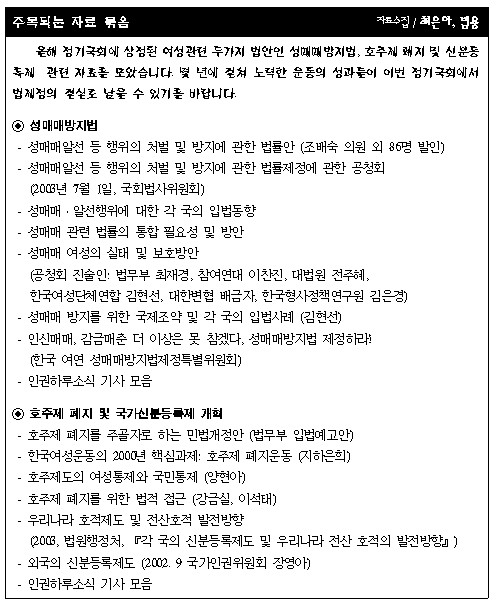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인권하루소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단지’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활동가로서의 우리를 교육하고 담금질해준 더없이 좋은 학교였으며, 신문에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모퉁이 한 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모멸당한 이들의 삶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장 급진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안 매체였다. 그러하기에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이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창간 정신 하나로, 인권활동가들의 열정 하나로 10년의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인권하루소식은 내다버리고 싶어도 내다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이기도 하다. 늘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일손에 허덕이며 활동가들이 일간 신문을 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으며, 때로는 24시간 취재?편집 체계를 가동해야 하기도 했다. 하루하루 바닥에서 긁어온 정보들과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분노와 희망을 기사로 담아내고 모양새를 갖춘 신문으로 펴내기까지에는 사무실 소파를 침대 삼아 칼잠을 자고 외박을 밥먹듯 해야 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있었다. 97년 지령 1000호의 머릿기사를 당시 발행인 서준식의 구속 소식으로 내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활동가로서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고 기꺼이 잡혀가야 할 그 시간, 한 걸음 떨어져 취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신문을 내야 했던 인고의 시간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지쳐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초기 팩스신문만이 갖출 수 있었던 속보성이라는 특장이 점차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밀려 퇴색하기도 했고, ‘운동하는 신문'을 만들겠다던 다짐만큼 인권하루소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해 왔던가 하는 회의도 똬리를 틀었다. 그러면서 폐간하자는 말들도 솔솔 흘러나왔다.
하지만 ‘작은 신문 큰 소식’, ‘신문에 안 나는 것 싣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판’, ‘반인권의 세상에 인권의 꽃씨를 뿌리는 신문’ 등 독자들이 인권하루소식에 붙여준 이름들은 그 모든 피로와 회의를 단번에 날려버릴 청량제가 되어주었다. 또 창간 당시나 지금이나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아나,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는” 모진 세상은 인권하루소식이 여전히 존재해야 할 까닭을 깨우쳐주고 있다.
“팩스용지 한두 장에 담긴 글들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한 독자의 이야기처럼, 이제 인권하루소식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에 머무르지 않고, 동일한 사건을 인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인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교육'을 통해 독자들을 인권지기로 만들어내면서 해방의 불씨를 지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10년의 격랑을 헤쳐오기까지 원고료도 없는 신문에 소중한 글들을 기꺼이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날카로운 필체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내리치고,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어준 이들의 글은 우리 사랑방 활동가들뿐 아니라 인권하루소식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부끄러움과 깊은 깨우침,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특히 97년 9월부터 <만화사랑방>으로 인권하루소식을 함께 지켜준 이동수 화백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인간을 모략하는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함께 자리잡고 있는 그의 인권만평은 어느 글 못지 않은 큰 감동과 깨우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다. 인권하루소식의 10년은 글과 그림으로 인권운동에 함께 참여해준 이들에게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인권하루소식에 더 이상 실릴 기사가 없는 ‘평화의 날’, 신문이 폐간되는 그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또 다시 강단지게 걸어가야 한다. 한 시대를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치는 ‘운동하는 신문’,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의 참된 인간해방의 열망을 담아내는 ‘작은 신문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비판받고 주저없이 진실을 말하겠다. 다시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가겠다.
2003년 9월 7일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권운동사랑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