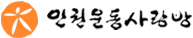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니다. 정부, 회사, 보수언론에서는 ‘연대 투쟁’을 당사자가 아닌 전문시위꾼, 음험한 조직들이 당사자들을 배후조종하기 위해 개입하는 ‘불순한 외부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해왔다. 그 유명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은 제 3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부산 영도에서도, 제주 강정에서도 ‘불순한 외부세력의 책동’이라는 그들의 꼬리표 달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 꼬리표는 연대하는 이들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투쟁의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당사자들의 투쟁을 그들의 투쟁이 아닌 외부세력의 ‘책동’으로 폄훼한다. 그래서 연대했던 이들은 대추리에서, 강정에서, 두물머리에서, 영도에서, ‘지킴이’, ‘날라리 외부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투쟁을 해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연대 파괴 공작이 소위 ‘당사자’라고 불리는 해당 대책위나 노조 내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책위원장, 노조위원장, 학생회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조직원이라고 하더라’,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다’ 등등. 결국, 조직이 사라지고 ‘개인’으로 남을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 끊기, 관계 끊기는 지속된다. 그래서 투쟁의 실패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기나긴 후유증을 남긴다.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회사를 옮기고, 연락을 끊는다. 조직, 단체, 사람에 대한 불신은 고독한 ‘개인’을 남긴다.
자율적 개인 VS 조직이라는 부당한 대립구도
흔히 ‘없는 사람들’의 무기는 뭉치는 것,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개인’이 될 때까지 부단히 구획 짓고 분리해나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위 진보적 언론과 매체들에서 자율적 개인 VS 조직이라는 구도로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자율적 개인’, 좀 더 정확히 말해 특정 운동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2008년 촛불 때 대거 거리투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구도는 조직 일반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내고, 마치 조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생산한다.

‘자율적 개인’이라는 강박
어떤 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병역거부를 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종교가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내가 왜 병역거부를 했는지 궁금해 한다. 만약 내가 종교가 있거나,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면 추가 질문은 없었을 것이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이 그렇게 다른가? 잘 모르겠다. 종교 역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일진데 말이다. 그리고 내가 만난 여호와의 증인들은 당연히 많은 고민과 결단 속에서 병역거부를 했었다. 그런데 사회가 운동가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매도한다. 종교 대신 이념이라는 말로. 마치 순수한 개인이 있고, 거기에 종교가 덧씌워지는 것처럼, 이념이 개인을 덧씌운다는 것이다. 나의 병역거부를 궁금해했던 사람들 중에도 ‘골수 운동권이었네’라며 대화를 그만둔 사람들도 분명 있었으리라.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이비 종교와 골수 운동권의 문제로 주로 봤었는데, 오히려 이 사회가 세상의 사물, 타인과 독립적인 순수한 ‘자율적 개인’이라는 상상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효과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덧붙임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