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다는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의 약자다. 뭘 하든, 첫빠는 말하고 표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원하는 바든, 맘에 안 드는 바든 일단 표현을 해야 그런 욕구와 불만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 존재가 드러나야 현실에 대한 개입 혹은 그런 현실을 바꿀 가능성 역시 생겨나는 거니까.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체벌은 교권'인 상황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처럼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보니, 앞으로 갈 길이 참 멀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도 만날 겸 ‘청바다란 게 있대요.’ 광고도 할 겸 청바다 기획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UCC강좌나 함 열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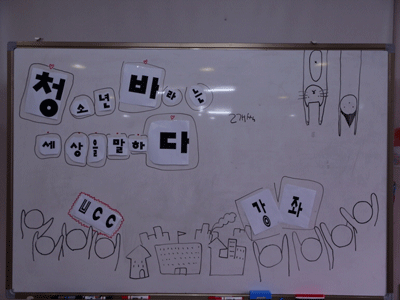
▲ 청바다 강좌 오리엔테이션 때의 모습
첫 강좌와 청바다 기획단
강좌는 '영상, 사진, 만화' 세 가지로 진행됐는데, 그 중 가장 참여인원이 많았던 건 영상강좌였다. 어디서 돈 안 들이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배울 기회가 흔치 않으니 당연한 결과이려나. 하긴 나만해도 관심은 있었는데 접할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손 놓고 있었으니까. 영상강좌는 총 8명이 모였다. 그 8명 중의 한 명이 나였는데, 내가 직접 참가한 강좌다 보니 청바다 강좌를 생각하면 영상 강좌를 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제일 많이 떠오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재정이 워낙 소박한 단체라 강좌는 전체적으로 가난하게 진행됐다. (흙흙) 그래도 영상강좌만큼은 미디액트라는 곳에서 장소와 장비를 전적으로 후원해준 덕에 비교적 빵빵했다. 예를 들어 강좌 일정 상 시간이 없어서 개인 작품을 강좌가 끝난 이후 집 등에서 알아서 찍어 와야 했는데, 미디액트 측에서 캠코더를 참가자 전원에게 대여해줬다. 근데 돈 한 푼 안내고 캠코더 대여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싸 룰루랄라’하면서 이 기회를 잘 받아먹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캠코더를 통해 혼자 놀기의 신천지를 발견하며 희희낙락했던 기억이……. 우히히. 손에 쥐고 이것저것 찍다보니 꽤 재밌어서 주변 소품들로 장난도 치고 하면서 혼자 완전 잘 놀았다. 그렇게 놀면서 찍은 영상들은 후에 영상 편집할 때 절묘하게 이용되기도 했다.
막연히 강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조금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신청기간동안 워낙 신청자가 없어서 의기소침했었다. 거의 매일 신청게시판을 들락날락했던 것 같다. 핸드폰을 잘 꺼놓고 다니는 편인데, 이 무렵엔 혹시라도 문의전화가 올까봐 충전에 매우 신경을 썼었다. 그럼에도 사진과 만화는 살짝 망했다싶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여서 마음이 쫌 아팠다. 그래도 지금 보면, 처음의 막연했던 바람을 나름 이룬 것 같긴 하다. 만나보진 못 했지만 만화나 사진 강좌에서도 한두 명씩은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나 또한 영상강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
삼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다들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건, 또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때나 쉬는 시간 짬짬이 수다 떨 때나 만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편하고 즐거웠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다. 지금도 함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면서 훈훈한 감정이 인다.
청바다 강좌 기획하면서, 강좌 때 만난 청소년들이랑 같이 ‘청바다 기획단‘ 을 꾸려 홈페이지가 생겨난 이후에도 오프라인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이어보자는 얘기들을 했었다. 한 번의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가, 각자 다른 영역에서 생활하고 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알고 있다. 그래서 ’청바다 기획단이 정말로 꾸려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기대되는 마음이 반, 주저되는 마음이 반 마음이 그렇게 반반으로 뒤섞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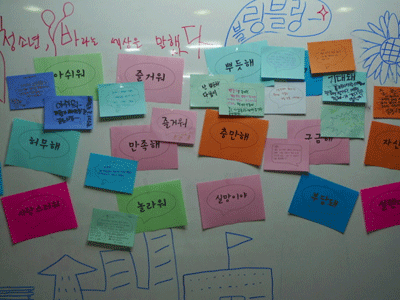
▲ 강좌가 모두 끝나고 작품 발표회를 하면서, 사진 만화 영상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모아 화이트보드에 모아봤다.
아직은 바라는 세상보다는 거친 현실을 말하다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말했다’ 라고는 하지만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말한 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상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영상으로든 만화로든 거울처럼 비춰보는 쪽이 더 비중이 컸다. 바라는 세상씩이나 얘기하기엔 아직 거쳐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마지막 작품발표회 날 우리가 만든 사진이며 만화며 영상들을 보면서 꽤나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함께 한 사람들과 청바다 기획단이라는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씬물씬 들었다. 청소년 문제니 뭐니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이라지만, 정작 필요한 얘기를 할 통로는 꽉꽉 막혀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또 자신들의 현실에 목소리를 낸다는 건,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목소리를 가두는 감옥이 너무 거대해서인지 여전히 크고 작은 난관들과 끈질기게도 마주치게 된다. 공부에 밀려 그런 걸 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며 차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하는 경우까지.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말하는 일은 당장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일상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신을 둘러싼 억압을 깨닫고, 그 억압에 짓눌려왔던 욕구들을 긍정하고, 바라는 세상을 스스로 외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는 경험이 쌓인다면, 언젠가는 ‘거울 같은 말하기’에서 ‘거울을 깨는 말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덧붙임
엠건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