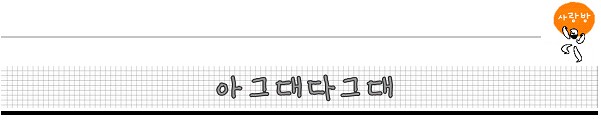
3월에는 ‘내 인생의 채널_ TV 프로그램’을 아그대다그대 이야기합니다.
 '영상앨범-山'일요일 오전 7시, 아침을 먹자마자 쇼파에 앉아 챙겨보는 다큐프로그램이다.
'영상앨범-山'일요일 오전 7시, 아침을 먹자마자 쇼파에 앉아 챙겨보는 다큐프로그램이다.
매주 산악인, 원정대와 함께 국내외 명산을 오르는 세계 산행기이다.
만년설과 빙하가 덮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부터 사계절을 경험할 수있는 킬리만자로,
정상까지 하얗게 빛나는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진 구름위의 섬 같은 황산까지 카메라 렌즈를 멍하니 따라가노라면 원래도 짧은 그 30분의 방영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대자연을 담은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영상미...
처음엔 고산등반을 과정을 몇박 몇일 촬영하느라
새까맣게 타버린 카메라감독의 코와 이마까지도 아름다워 보였지만,
히말라야 14좌를 코앞에 두고 죽은 산악인 고미숙의 소식을 듣고 나서부턴
깍아지른 듯 한 봉우리와 거대한 눈절벽이
겁 없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언제 또 소리 없이 덮쳐버릴까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한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구라도 산을 동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갈 수 없어서(돈이 없어서)더 그럴지도..
유유리
 '브이'. 진짜 너무너무(*100) 무서웠다.
'브이'. 진짜 너무너무(*100) 무서웠다.
외계인들의 피부가 벗겨져 파충류의 속살이 보이는 장면이나
쥐를 통째로 삼키는 장면은 어린 내게 충격 그 자체였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도노반과 엘리자베스 등 '우리편'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엔 그 긴박감으로 심장이 콩닥콩닥!
그리고 똘똘이, 편리, 가가멜, 아즈라엘 등이 나왔던 '개구쟁이 스머프'.
어렸을 적 우리 집엔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스머프는 파란색"이라고 했다.
'설마!!!'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파란색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 집 텔레비전을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꾼 후 등장한 파란 스머프 앞에서
난 질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파란색 스머프는 황홀했다.
귀여운 것들.ㅋㅋ
'주말의 명화'도 빼놓을 수 없지.
어렸을 적 토요일 밤늦게 시작하는 외국영화를
가족들을 따라 보고 있으면 왜 그리 잠이 오는지.
영화를 끝까지 보고 싶어도 도저히 저절로 감기는 눈을 뜬 채로 버틸 수가 없었다.
영화 보는 내내 "저건 왜 저런 거야?" 따위의 질문 공세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다
혼자 스르륵 꿈나라로. 어른들이 주문이라도 걸어놓은 걸까?
돌진
 TV를 끼고 보는 편은 아니라서, 크게 TV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은 듯하다.
TV를 끼고 보는 편은 아니라서, 크게 TV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은 듯하다.
각종 만화프로그램들은 <만화>의 범주로 기억되는 것 같고.
그래도 기억나는 TV 프로그램을 고른다면,
벌써 10년도 넘었지만,(⊙o⊙ 헉!!!)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시트콤!! >.<;;;
미국드라마 <프렌즈>의 아류작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신동엽, 우희진 등이 나와서 정말 더럽고 유치하게 진짜 웃겼다. 하하하
그 즈음 백수처럼 살던 때가 있었는데, 밤새고 아침에 잠들고 오후5시쯤 일어나서
그 시간에 시작하는 만화를 죽 보고나서 6시 반이던가 7시이던가
<남자셋 여자셋>을 보고나면 저녁8시경.
그제서야 잠을 깨서 하루일과를 시작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크윽.
아해
 아. 처음 써보는 아그대다그대다.
아. 처음 써보는 아그대다그대다.
ㅎㅎㅎ 내 인생의 채널까지는 아니고
요즘 M본부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S 방송국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K방송국처럼 교육적(?)이지도 않지만 비주류틱한게 꽤 재밌어요.
얼마 전에는 이준기가 나왔던 히어로에 빠져 있었어요.
시청률을 정말 최악이었지만
거대 신문사의 부조리에 싸우는 3류 일보 기자의 모습이
마치 조중동과 싸우는 우리네 모습 같았거든요.
아무리 고군분투해보아도 자본과 여론에
무력해지는 주인공의 모습에 꽤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크응 아. 조중동 생각하니 또 승질나네;;;;;
은진
 <천사들의 합창>을 꼬박 챙겨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천사들의 합창>을 꼬박 챙겨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얼마 전 우연히 들은, 나름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이 외국드라마가 남미에서 제작된 거라고...
오호라. 어린 시절 다양한 외국인이 있구나 처음 접해 놀라고,
마리아 같은 선생님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보고,
안경 끼고 나왔던 똘똘했던 여학생이 꽤나 꽂혔었는지 안경을 끼고 싶어서
매일 화면을 코앞에 두고 봤었던(결국 그 덕에 20년이 넘게 안경을 끼고 있다는 -_-::)
천사들의 합창. 뭔가 알콩달콩 지지고 볶는, 갈등도 많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시 희망을 확인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하다.
ㅁ
 갖고 있는 드라마 대본이 100편이 넘는데..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읽지도 않습니다.
갖고 있는 드라마 대본이 100편이 넘는데..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읽지도 않습니다.
드리마는 대사 들으면서 지켜볼 것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 집에 놀러가면 재방으로 이어서 보고..
사이 못 보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내 머리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듣고 내용전개를 확인합니다.
노희경 작품을 기다렸는데 곳 방영한다고 하니 기대되고.
김수현 작품도 곧 방영한다는데 또 대가족 얘기가 아닐지.
임성한 작가는 다음 작품에도 불교전파 내용일지.
김정수 작품 '민들레 가족'을 보고 싶었으나 가족들이 모두가 징징대서 보다 말았죠.
추노를 못 보고 있어서 아쉽지만.
다모를 보았던 것처럼 전편DVD를 이틀 동안 내내 이어서 보는 방식으로
그 재미를 만끽할 수 있겠죠.
좋은 작품은 시간이 흘러도 감동적이니까요.
그외 일요일 진품명품/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 좋아하고. 9시 뉴스 봅니다.
연애/오락프로는 안봐요.
전파가 아까울 정도로 품격없어 화나게 하는 프로그램들..나빠요.
일숙
 텔레비전을 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라고 하기에는
텔레비전을 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라고 하기에는
가끔 켜진 텔레비전을 넋 놓고 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찾아서 본 건 오래된 듯.
그러고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텔레비전을 꽤나 열심히 찾아본 듯도 한데,
서울 올라와 살면서 텔레비전 없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듯도.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화가의 딸>. 외국 드라마였다.
일주일에 두 번?
자정에 시작해서 한 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부모님 주무시는 동안
내 방으로 옮겨와 보고 나서 갖다 둘 정도로 정성껏 ! 봤던 드라마.
근데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 안나. 큭.
그래도 (아마 나나 무스끄리가 불렀던)
only love(제목 맞을라나?)라는 주제곡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꽤나 오랫동안 가사도 외우고 있었는데,
드라마의 무엇이 나를 그렇게 잡아 끌었는지 다시 보고 싶다.
(근데 <화가의 딸> 얘기를 언젠가 아그대다그대에서 했던 것만 같은 기억이...
흠, 언제였지? )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멋대로 해라>.
고복수(양동근)와 전경(이나영)의 '사실적인' 사랑 이야기도 매력적이었지만
송미래(공효진)라는 인물이 정말 멋있었다.
이때는 이미 텔레비전에서 멀어졌던 때라, 다시보기로 거의 2박3일을 투자해서 보긴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된다는 건 나름 희망적이었지. ㅎ
미류
 역사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데요..
역사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데요..
얼마 전 했던 선덕여왕은 요즘 한국의 현실 정치를 생각하게 해서 재미있게 보았답니다.
정치가 사람들의 자치를 포함한 것이 아닌 '정치꾼'들의 소유가 되어
'정치'의 내용이 달라지는 지금의 현실을 많이 생각하였답니다.
이명박 들어 언론장악으로 우민화정책이 본격적으로 들어내는지라 더욱...
바람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