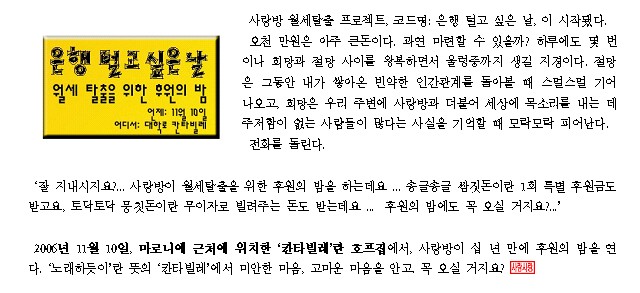|
명륜동 2가 8-29번지이구요.
혜화 로타리에서 성대 방향으로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란 한복집이 있어요. 그 건물 4층이에요.
‘인권운동사랑방’ 간판이 없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올라오세요.
간판이 원래 없거든요.
‘까르르르...’
이런 사무실에선 백 년 만에 들을 수 있을까 말까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자원활동 하러 오신 거예요?’하며,
낯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도 갖추지 않은 서글서글한 표정을 한 젊은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한 순간에 무장해제 당한 나도, 배시시,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했던 것 같다. 1999년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하여간 그 즈음.
‘위층에는 회의실이 있어요.’라는 말에 ‘그래, 나름 유명한 단체잖아’ 생각하며 따라 올라간 곳에는 두 세 평 남짓한 옥탑 방이 있었다. 건물이 지어질 때 발랐을 법한 누런 벽지를 그대로 붙인 채로. 그리고 옥탑 방 옆 복도(일방통행만이 가능하다) 구석에는 역시 백 년 전에 설치된 것 같은 개수대와 가스레인지 하나 덜렁 놓인 싱크대가 있었다. ‘여기는 부엌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감자를 깎고, 마늘을 빻고, 파를 다듬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원활동가와 어쩌다 들린 손님 등까지 합쳐 십오륙칠팔 인분의 음식을 하루에 두 번 해먹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보통은 밤 11시, 12시, 새벽 한두 시까지 글을 쓰고, 전화를 받고, 회의를 하고, 하루소식을 만들고, 영화제를 준비하고, 피켓과 선전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끔 혹은 자주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불렀다. 가끔 혹은 자주 심각하고, 우울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 보다는 많이 웃었다.
‘까르르르’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우연히 상임활동가들의 활동비가 35만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랑방은 그 건물의 3층까지 확장 이사를 했고, 새로운 상임활동가들을 맞았다. 그때 나는 35만원의 가난한 활동가의 삶과 활동비를 올리는 대신 새로운 활동가들을 맞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003년에 나도 그 낭만에 동참했다. 하지만 나에게 35만원은 낭만이 아니었고, 가난이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한마디로 생고생이었다. 2005년 나는 다시 돋움활동가로 변신했다. 상임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그 해도 여전히 활동비는 35만원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담배 값도 천 원이나 오른 마당에.
35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 술 끊고, 핸드폰 끊고, 과일 끊고, 인간관계 끊고 살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활동가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식당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글도 쓰고, 신문을 돌리기도 한다. 그리고 명륜동 2가 8-29번지 사무실로 다시 기어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지하철을 놓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고, 그보다는 자주 활동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기한다.
활동가들이 생계 때문에 운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운동 때문에 생계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은 모두 안타깝다.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더 많은 활동가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 고민... 고민만으로 어림잡아 백 년이 흐른 것 같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나? ‘이사하자! 전세로!’ 사무실에서 고등어조림에 밥 먹고 있을 때였던가? 누군가 말했다. 고등어 뼈를 발라내느라 한창 바쁘던 손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했다. ‘진작 말하지!!!’
월 임대료 170만원. 월 평균 지출의 20%다.
월세만 줄여도, 활동비 10만원씩 올리고, 새 활동가도 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사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이사 해야지, 이사해야 되는데..’ 말로만 밍기적 밍기적 거의 일 년을 보낸 후, 몇 달 전부터 사무실을 보러 다녔다. 근데,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님 멍청했던 걸까? 아무리 줄여 가더라도 우리 보증금으로 전세를 들일 착한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 오천만 원은 더 있어야 지금의 월세를 대폭 줄여 갈 수 있었다. 정말이지 21세기 초 한국의 주거권 현실은 가혹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의 밤을 하기로 결정했다. 참 어렵게 결정했다. 사랑방 역사상 십년 전에 후원의 밤을 처음 연 후 다시는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을 이번에 깬 것이었다. ‘이번에 딱 한번만!’이라고 수없이 서로에게 말했다. 나중에는 후원 행사 이름을 ‘딱 한번’이라고 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