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이 무엇을 하는지, 보내주는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소박한 심경에서 만든 임시적 복사물”

지난 <사람사랑>을 들춰보다 발견한 말입니다. 1995년 발행을 시작한 사람사랑에 대해 박래군 활동가가 기억을 더듬으며 적어둔 문장이지요. A3 복사지를 정직하게 반으로 접어서 네 쪽으로 만들고, 흔한 표지도 없이 인권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줄글로 시작하는 소식지 <사람사랑>. 지금으로 치면 후원인이지만, 당시에는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사랑방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100여 명에게 정해진 형식 없이 사랑방 소식을 빽빽하게 채워 발송한 것이 <사람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도 못하면서 묘하게 당당함이 느껴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랑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지난 25년 동안 300호에 이르기까지 사람사랑은 어떤 내용을 담아왔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90년대 사람사랑 사용법
사무실 책장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사랑>을 간혹 꺼내서 읽어보려 하면 딜레마에 봉착하곤 합니다. 1호부터 읽기 시작하자니 끝이 보이지 않고, 특정한 편만 골라 보자니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수차례 시도 끝에 찾아낸 <사람사랑> 제대로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몇 호든 상관없이 내가 읽기 시작한 호수부터 꾸준히 읽으며 흐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95년 9월 <사람사랑> 7호에서는 과거청산과 불처벌 문제 해결, 시민·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사회권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확장까지 3가지 사랑방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사랑을 차근히 읽다보면 세 가지 과제들을 사랑방이 어떻게 운동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령,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95년 10월 <사람사랑> 8호에서 당시 사랑방이 간사단체로 있었던 인권단체협의회의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움> 개최 일정이 확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이후 심포지움에서는 탈냉전 시기의 아시아지역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것을 홍보하는 내용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포지움 이후 후속 활동으로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 활동가들이 고민을 이어나가기 위한 평가 토론회자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사례를 모아 자료집을 만드는 작업까지 이어간 모습을 꾸준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아닙니다. 사회권 확장을 위해 IMF체제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권 운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며 98년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책을 발행하는 과정이나,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인권의 대중화에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 인권 영화제를 어렵게 개최하는 모습 등을 <사람사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90년대 <사람사랑>은 좁게는 사랑방이 어떻게 움직였나부터, 넓게는 인권운동은 어떤 고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자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임시적 복사물로 시작했다는 말처럼 초기 <사람사랑>은 정해진 규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방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안내, 조직 운영에 관련한 소식, 새로이 입수한 자료 목록, 활동가의 신상 변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야 꾸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내용을 제외하면, 초기 <사람사랑>은 제호부터 꼭지 구성, 판본까지 정말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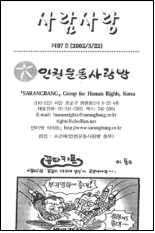
자문위원 체계에서 회원통신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자문위원 체제가 없어지고 회원통신이라는 제호도 사라지게 됩니다. 줄글로 시작하던 소식지에 어느 시점부터는 표지가 생겨나고, 활동 보고 형태가 아니라 활동가의 고민을 담은 글들도 하나 둘 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랑방에서 발행하던 <매일 인권 뉴스 인권하루소식>에는 다 담지 못한 기사의 뒷이야기가 <사람사랑>에 실리기도하고, 90년대 활동가들의 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사랑방 자원활동가들의 글도 실립니다. 100호를 향해가는 <사람사랑>은 임시적 복사물을 넘어 어느새 후원인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한 어엿한 소식지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후원인 소식지 사람사랑으로~
90년대 <사람사랑>이 단체 활동과 사업들을 후원인에게 잘 보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2000년대 <사람사랑>은 사랑방 활동가와 후원인들의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후원자 모임 회원들의 기고 글부터 자원/돋움/상임 활동가들의 편지가 <사람사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린 여러 편지들을 읽다보면 사랑방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원활동가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랑방 활동을 했던 상임, 돋움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도 많지만, 문득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물론 현재 사랑방 활동가들의 기대와 걱정, 포부가 느껴지는 예전 글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부정기적으로 만났던 후원인들을 2008년부터 후원인 인터뷰 꼭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눈에 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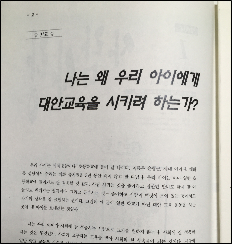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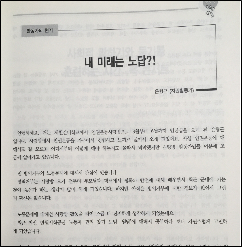
역사가 긴 소식지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글도 있습니다. 2004년에 은종복 후원인이 ‘나는 왜 우리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시키려 하는가?’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자본의 굴레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몸은 비록 조금 여윌지라도 마음은 편할 수 있는 삶을 바라기에 대안교육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아이, 은형근님이 2015년 제천간디학교 졸업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형근님은 사랑방에서 활동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면서, 대안학교 12년이라는 스펙으로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섞인 ‘내 미래는 노답?!’이라는 자원활동가 편지를 썼더군요.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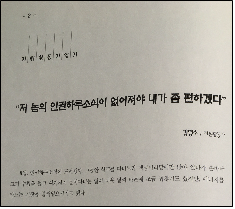
사랑방 하면 떠오르는 <인권하루소식>이 2006년에 종간하고 새로운 인터넷 신문 <인권오름>을 창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람사랑>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활동가들이 고단함과 자괴감 그리고 배움터였다는 애증의 모습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묘사합니다. 오죽했으면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는 제목의 자원활동가 편지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다보니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임기 이후의 안식휴가 소식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10년 만에 열었던 후원의 밤 ‘은행 털고 싶은 날’ 행사를 통해 전세자금을 모아서 중림동으로 이사를 했던 이야기도 <사람사랑>에 생생하게 잘 남아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인권연구소와 인권교육실이 각각 ‘창’과 ‘들’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의 고민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사랑방은 앞선 시기 활동의 성과들이 쌓이면서 가능했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사랑방은 ‘어떤’운동을 고민해왔을까
활동가의 편지, 인권하루소식 꼭지 등으로 드러나는 2000년대 인권운동/사회운동의 의제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전 평화운동입니다. 이라크 전쟁 반대와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이 전국적인 싸움이 되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상황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이 당시 ‘북한인권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사랑방은 ‘북인권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이랜드와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인권운동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2007년 사랑방은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을 열심히 준비해 함께합니다. ‘상처투성이 운동에 연고를 바르고’ 운동의 본새와 체질을 바꿔 설레는 사회운동을 만들자는 그 때의 기대와 포부가 <사람사랑>에서 느껴집니다. 2020년 지금 더욱 필요한 고민과 실천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사랑, 활동가를 드러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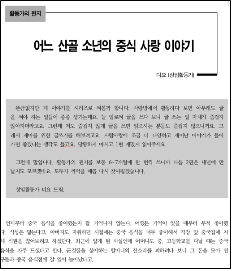
201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사랑>은 지금의 외형과 거의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변화는 외형보다 글쓰기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00년대 <사람사랑>이 다양한 활동가의 글을 담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방의 활동보고 중심의 소식지였다면, 2010년대에는 더욱더 활동가를 드러내는 글이 중심인 소식지가 된 것이죠.
가장 변화가 두드러지는 꼭지는 ‘활동가의 편지’입니다. 기존에는 ‘활동가의 편지’를 통해서 자원, 돋움, 상임활동가의 개인적인 글쓰기부터 활동의 고민까지 다양하게 담아냈었는데요. 사랑방의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활동이야기’ 꼭지를 신설해서 작성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기존 ‘활동가의 편지’는 좀 더 활동가 개인의 고민을 담아내는 꼭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활동가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글을 써보겠노라 했지만 결국 운동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활동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활동가는 ‘이걸 도대체 후원인 소식지에 왜 썼나’ 싶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기도 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사람사랑은 계속됩니다
매달 후원인분들께 사람사랑을 발송하고 나면 남는 종이소식지는 사랑방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께 한 부씩 건네 드리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래군 활동가가 사랑방을 방문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사랑>이 새로 나왔으니 읽어보시라고 손에 쥐여 드렸죠. 그랬더니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소식지 만드냐’고 물으시더군요. 마감에 쫓길 때마다 애써 외면해온 ‘이렇게 글자 많은 소식지를 과연 누가 읽을까?’ 싶은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활동가들끼리 <사람사랑>이 후원인 소식지로서 여전히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봤죠. 그 결론이 지금의 300호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후원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부터, ‘소식지의 구성은 어떤지’까지 하나씩 꼼꼼히 따져봤지만 <사람사랑>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글자 수는 많지만, 그만큼 사랑방의 역사를 가장 잘 담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방답게 사랑방의 소식을 후원인 분들과 나누는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랑방의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사랑방이 확장해야 하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더 궁리해보기로 중지를 모았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사람사랑>의 역사를 정리하는 글을 써보기로 했는데요. 읽어주시는 후원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꾸준히 발행하나보다 싶었던 소식지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설마, 글씨가 너무 많다고 그냥 덮으신 것은 아니겠죠?^^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사랑방 소식을 전하는 <사람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