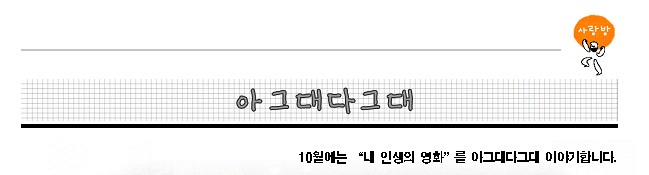
 <귀향>, 페도르 알모바도르 감독, 그녀들, 어쩜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녀들의 고향은 바로 그녀들의 우애, 관계 그 자체이리라. (미류)
<귀향>, 페도르 알모바도르 감독, 그녀들, 어쩜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녀들의 고향은 바로 그녀들의 우애, 관계 그 자체이리라. (미류)
 <러브 레터>, 이와이 순지 감독, 일본 영화가 개방되기 이전, 친구의 컴컴한 하숙방에서 지직거리는 불법비디오로 봤던 영화, 그 아지랭이 같던 시절의 봄햇살 같던 영화 (명수)
<러브 레터>, 이와이 순지 감독, 일본 영화가 개방되기 이전, 친구의 컴컴한 하숙방에서 지직거리는 불법비디오로 봤던 영화, 그 아지랭이 같던 시절의 봄햇살 같던 영화 (명수)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마르크 카로 + 장 삐에르 주네 감독, 몽환적인 음악 끝, 기이한 나라의 그들 : 꿈을 꾸지 못해 늙어버린 과학자, 우락부락 순수한 차력사, 세상을 아는 예쁜 여자아이, 잠꾸러기 여섯 쌍둥이, 뇌밖에 없는 친구,,, 웃어야할지 슬퍼해야할지 그로테스크 순수 동화 한편! (괭이눈)
 <브이 포 벤데타>, 제임스 맥테이그 감독, "왜 죽지 않는 거지?" "이 가면 뒤에는 살덩이만 있는 게 아냐. 이 가면 뒤에는 한 사람의 신념이 있지. 총알로는 죽일 수 없는 신념이...." 수많은 사람들이 V의 신념을 따라 가면을 쓰고 런던거리를 장악할 때의 그 감동이란... 통제된 공포사회를 부수는 유쾌하고도 철학적인 대사들이 넘쳐나는 영화. (경내)
<여군 외출> 감독 몰러요.
고등학교 시절 기말 고사를 마치고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 간 어처구니없는 영화. 영화 선택의 이유를 묻자 뭔 말이 많냐는 대답으로 한 큐에 정리. 결국 끝가지 개기다가 남들 영화 보러 갈 때 남아서 강제학습을 해야 했던 슬픈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영원)
<브이 포 벤데타>, 제임스 맥테이그 감독, "왜 죽지 않는 거지?" "이 가면 뒤에는 살덩이만 있는 게 아냐. 이 가면 뒤에는 한 사람의 신념이 있지. 총알로는 죽일 수 없는 신념이...." 수많은 사람들이 V의 신념을 따라 가면을 쓰고 런던거리를 장악할 때의 그 감동이란... 통제된 공포사회를 부수는 유쾌하고도 철학적인 대사들이 넘쳐나는 영화. (경내)
<여군 외출> 감독 몰러요.
고등학교 시절 기말 고사를 마치고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 간 어처구니없는 영화. 영화 선택의 이유를 묻자 뭔 말이 많냐는 대답으로 한 큐에 정리. 결국 끝가지 개기다가 남들 영화 보러 갈 때 남아서 강제학습을 해야 했던 슬픈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영원)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
배두나가 좋아서 보았고 <별>의 배경음악이 멋졌던 영화~ (유성)
<비포 선 셋> 리차드 링클레이터
구년 전 하루 동안 생겨난 사랑을 기억하는 두 사람의 만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레임, 빠리의 낭만에 그만 푹 빠졌었더랬지. 'a waltz for a night'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른 줄리 델피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네. (혜영)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
배두나가 좋아서 보았고 <별>의 배경음악이 멋졌던 영화~ (유성)
<비포 선 셋> 리차드 링클레이터
구년 전 하루 동안 생겨난 사랑을 기억하는 두 사람의 만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레임, 빠리의 낭만에 그만 푹 빠졌었더랬지. 'a waltz for a night'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른 줄리 델피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네. (혜영)
 <미션> 로랑 조페 감독,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흐르는 영화. 다가오는 총탄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들고 스페인 군대를 향해 걷는 사람들..... 다가오는 총탄에 맞서 총을 들고 스페인 군대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그때도 지금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이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은아)
<미션> 로랑 조페 감독,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흐르는 영화. 다가오는 총탄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들고 스페인 군대를 향해 걷는 사람들..... 다가오는 총탄에 맞서 총을 들고 스페인 군대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그때도 지금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이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은아)
 <뮤리엘의 웨딩> P.J. 호건 감독
아바의 댄싱 퀸이 시원스레 울려 퍼지는 영화. 주인공에 빠지지 않아도, 멋진 배경이 아니어도 좋은 영화가 있군. 근데 왜 좋지 이 영화가??? (근예)
<뮤리엘의 웨딩> P.J. 호건 감독
아바의 댄싱 퀸이 시원스레 울려 퍼지는 영화. 주인공에 빠지지 않아도, 멋진 배경이 아니어도 좋은 영화가 있군. 근데 왜 좋지 이 영화가??? (근예)
 <바그다드 까페>,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강제학습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가서 하나씩 꺼내봤던 비디오키드 시절, 한창 '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던 영화. 황량한 사막을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보이게 했던 우정의 힘. 하지만 [내 인생의 **]로 하나만 꼽는 건 역시 어렵고 싫다. 덤으로 하나 더. <크라잉게임> (석진)
<바그다드 까페>,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강제학습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가서 하나씩 꺼내봤던 비디오키드 시절, 한창 '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던 영화. 황량한 사막을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보이게 했던 우정의 힘. 하지만 [내 인생의 **]로 하나만 꼽는 건 역시 어렵고 싫다. 덤으로 하나 더. <크라잉게임> (석진)
 <랜드 앤 프리덤>, 켄 로치 감독, 세미나 자료를 찾기 위해 어두운 비디오방 구석에서 홀로 봤던 영화. 폭력과 비폭력, 일국혁명과 노동자 국제주의, 볼셰비즘과 아나키스트, 자유(프리덤)를 보장하는 땅(랜드)과 땅이 속박하는 자유… 60년 전 고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 영화 막바지 늙은 사회주의자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지는 인터내셔널을 요즘도 가끔 듣는다. (성준)
<칠레전투> 파트리시오 구즈만 감독, 영화 안밖으로, 내 인생과 뗄 수 없는 영화. 군중을 장악하는 영웅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동자도 모두 같은 주인공. 손수레를 끌고 가는 놀랍도록 빠른 발과 슬픈 투쟁가가 기묘하게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장면. 언해피엔딩. 그리고 그게 모두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이래. (인권영화제를 재정적으로 기사회생시킨 영화이기도 함) (정아)
<랜드 앤 프리덤>, 켄 로치 감독, 세미나 자료를 찾기 위해 어두운 비디오방 구석에서 홀로 봤던 영화. 폭력과 비폭력, 일국혁명과 노동자 국제주의, 볼셰비즘과 아나키스트, 자유(프리덤)를 보장하는 땅(랜드)과 땅이 속박하는 자유… 60년 전 고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 영화 막바지 늙은 사회주의자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지는 인터내셔널을 요즘도 가끔 듣는다. (성준)
<칠레전투> 파트리시오 구즈만 감독, 영화 안밖으로, 내 인생과 뗄 수 없는 영화. 군중을 장악하는 영웅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동자도 모두 같은 주인공. 손수레를 끌고 가는 놀랍도록 빠른 발과 슬픈 투쟁가가 기묘하게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장면. 언해피엔딩. 그리고 그게 모두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이래. (인권영화제를 재정적으로 기사회생시킨 영화이기도 함) (정아)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
내 생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두 번이나 본 영화. 영화 시작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 어찌나 내 가슴을 뛰게 하던지. 광대들의 삶이 서러워 눈물깨나 쏟았던 영화.(유라)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
내 생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두 번이나 본 영화. 영화 시작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 어찌나 내 가슴을 뛰게 하던지. 광대들의 삶이 서러워 눈물깨나 쏟았던 영화.(유라)
 <말죽거리 잔혹사> 유하 감독, 1970년대 말 어두운 학교폭력의 현실, 그와는 대조되는 첫사랑의 아릿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맷집 좋아야 버틸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울 수만은 없겠지만. 좋은 영화도 아닌데, 그냥 내 생을 반추해 볼 수 있어서.(래군)
<말죽거리 잔혹사> 유하 감독, 1970년대 말 어두운 학교폭력의 현실, 그와는 대조되는 첫사랑의 아릿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맷집 좋아야 버틸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울 수만은 없겠지만. 좋은 영화도 아닌데, 그냥 내 생을 반추해 볼 수 있어서.(래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