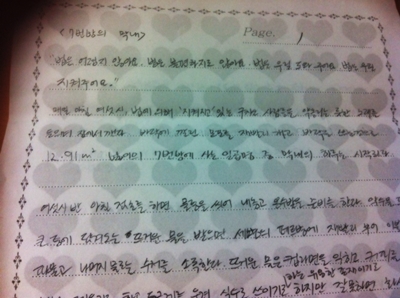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릴 지켜주어요.”
매일 아침 여섯시, 법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구치소 사람들을 약 올리는 듯 한 노래를 들으며 잠에서 깬다. 바닥에 깔린 모포를 재빨리 개고 바닥을 쓰는 것으로 12.91m2 넓이의 7번방에 사는 일곱 명 중 막내의 하루는 시작된다.
“막내야, 징역은 언제나 긴장해야 하는 거야.”
여섯시 반, 아침 점호를 하면 물통을 씻어 내놓고 온수 받을 준비를 한다. 약수 뜨는 큰 통에 담겨오는 뜨거운 물을 받으면 세병의 페트병에 재빨리 부어 이불속에 파묻고 나머지 물로는 수저를 소독한다. 뜨거운 물은 컵라면을 익히고 커피를 마시고 간식을 데우기도 하고 둥굴레를 우려 식수로 쓰이기도 하는 유용한 존재이지만,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위험한 존재이다. 일하는 첫날 두세 번째 손가락엔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고, 2주가 된 지금은 굳은살이 되었다. 뜨거운 물이 항상 있도록, 적당한 양의 둥굴레 물이 있도록, 날이 더울 땐 찬물에 담가 식히고 물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막내의 몫이다. 하루 세 번, 밥 먹기 전에 항상 같은 방식이다. 이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마시는 게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잘 모르겠다.
밥을 먹고 나면 7인분의 식기와 밥․국통, 반찬통을 설거지 한다. 그릇을 놓는 위치부터 설거지 순서 등이 잘못 되면 불호령이 떨어진다. 속도가 느려도 핀잔을 듣고, 빨리 하다 설거지가 지저분해도 혼난다. 소독기도 없고 좁은 공간이라 쳥결과 위생관리는 철저해야 한다. 싱크대는 내 키에는 턱없이 낮지만 이나마도 화장실에 쪼그려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야만적이라고 느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조치로 설치되었다. 식후에 찬합, 컵을 씻고 행주를 널면 식후 일은 끝이다.
간식준비, 신문 접기, 간식정리, 식기 햇빛에 말리기, 소변 앉아서 일보기, 운동할 때 운동화 내놓기, 밖에서 모포 털거나 밤에 모기가 들어올 거 같으면 방충망 찾기 등등 하나같이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이다. 바른 자세로 앉기, 면도하기, 먹으라 권하면 거절하지 않기, 장기 상대, 말 상대되기 등등은 이곳뿐 아니라 한국의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선 비슷한 막내의 고충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존중받지 못하고 한 조직의 부품처럼 돌아가는 방식 말이다. ‘징역생활 혼자 하냐?’ 따지고 보면 많지도 않은 일이지만 빠르게 하지 못하면 쏟아지는 면박, 눈치 등등. 무언가 빼놓았을까? 실수했을까? 하는 불안감. 하루 이틀 만에 쏟아지는 인간에 대한 평가, 내 바로 윗사람, 방경험이 많은 그가 몇 번이고 내게 “막내야, 징역은 언제나 긴장해야 하는 거야.” 바로 그 긴장이 날 고되게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막내’의 역할이나 방내의 서열은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구치소의 여러 규정에 적응하고 징역경험이 많은 소위 “빵잽이”간에 공유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남성문화 혹은 서열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방에 들어온 순서, 재산의 정도, 얼마나 강해 보이는가, 징역경험의 정도나 죄목, 그리고 개개인의 처사에 따라 미묘하게 나눠진 역할에 따라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한다. 물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면면에 따라 방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내 바로 윗사람이 누구인지, 봉사원(방장역할)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또 달라진다. 나는 내 방에 있던 사람들이나 나를 조이거나 어르는, 그래서 날 매우 힘들게 했던 선임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 이거나 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그것은 어리바리한 나를 위한 꾸중이었을 수도 있고 방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있는 7번방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의 방이다. 1년 6개월 딱 정해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나와 달리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판사의 말 한마디에 무죄냐 유죄냐, 1년이냐 2년이냐, 그리고 언제쯤 결론이 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즉 미결수들의 방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 가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7명’이 아주 좁고, 많은 것들이 제한된 공간에 부대껴서 살아가면 갈등과 짜증이 쌓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내 스트레스와 고달픔 이전에 이러한 조건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었다.
‘양심’이 고뇌하는 시간
처음 며칠간은 군대에 가면 이보다 더 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며칠이 더 흐르니 군대보다 시집살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징역살이는 시간이 지나고 다음 ‘막내’가 들어오면 되지만, 시집살이는 끝도 없을 테니 말이다. 굳이 막내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서 존중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을 하며 ‘선임’ 시어머니들의 눈칫밥을 먹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고작 2주간의 수용생활에 대한 지나친 오바일 수도 있다.
굳이 시집살이까지 가지 않아도 남성들만의 공간에서 ‘너도 똑같은 남자’임을 전제로 이뤄지는 여성에 대한 온갖 비하나 혐오와 성적대상화는 몸보다 마음을 괴롭힌다. 정치인이든 성직자든 시민단체 활동가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틈틈이 드러나는, 어쩌면 나조차도 버리지 못한 그런 감각들이, 시간이 어디보다 값싸고 어차피 너나 나나 나쁜 놈이라 전제되는 이곳에선 노골적으로 시간죽이기용 ‘농담’으로 포장되어 습관처럼 흘러나온다.
적당한 허세와 욕으로, 그리고 성적 농담으로 무장한 사람들 뒤에서 나 또한 무뎌지고 약간의 무장으로 나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 몇 년간 노력해온 것을 이어 더욱 예민해지고 불편해하며 동반되는 스트레스를 견딜 것이냐 하는 고민은 비슷한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 나에게도 여전히 따라오는 선택지다. 그러니까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내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해서 결코 입증되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다.
덧붙임
본명은 성민, 이리저리 활동하고 살고 여행하다 2013년 11월 18일 입영을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