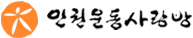누구에게나 무엇이든 시작은 있다. 그 시작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동반하기 나름이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 공포와 두려움을 누르고 ‘대범’하고 ‘씩씩’하게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주문한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머뭇거린다면?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가 망설이는 이유나 상황이 이해되면 ‘조심성 많은 아이’가 되지만 그 이유가 황당무계하게 느껴지면 그저 답답한 ‘겁쟁이’가 된다. 아이들이 용감하게 다양한 경험 속으로 뛰어들고 그 안에서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아이들의 행동을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끌어올리려 할 때 성장이 가능할까? 혹은 어른이 되면 낯선 세상과의 조우에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도전! 을 외치게 되던가?
낯설은 세상 속에서, 어떡하지?


집 안을 꽉 채운 코끼리만큼이나 조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하고, 집에 코끼리가 사는 것만큼이나 어른들이 보기에 조의 걱정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 아기는 씩씩하지’하는 식으로 단속하려 들거나 ‘엄마/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울타리를 치며 두려움 자체를 무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마음이,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은 지금의 나의 행동이 소심하거나 못난 아이처럼 비쳐질 때 아이들은 그저 입을 닫을지도 모른다. 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두려움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는 기회를 가로막을지도 모를 일이다.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논리적 설명이나 도전의 강요는 오히려 해보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과 어긋나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려낸 『어떡하지?』에 대한 소개에서 앤서니 브라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지요. 하지만 늘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를 톰의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 사실 엄마도 걱정에 빠진다. ‘정말로 속상해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처음 경험하는 일에 대한 불안이 아이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앞일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빌리의 걱정에 대처하는 방법

할머니가 무엇인가를 겁내는 빌리의 마음을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무작정 잠재우려 했거나 사내아이답지 못하다며 용감해질 것을 채근했어도 빌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빌리의 마음에 공감함으로써 빌리에게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나의 걱정이 이상한 게 아니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걱정인형의 걱정인형까지, 걱정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쉽게 아이들의 이야기나 걱정은 소홀히 여긴다. ‘그 때는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다. 어른들의 이런 영혼 없는 대응에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 앞서 거세하는 법을 먼저 습득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키우게 된다. 어른들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잠 재울 수 없다. 빌리처럼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스스로 그 일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아이의 마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행동과 경험들이 쌓일 때 생각의 변화도 찾아온다. 어떤 두려움은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멸하기도 하고 커가면서 대처능력을 갖추기도 한다. 다양한 도전과 실패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대처능력이야말로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덧붙임
묘량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