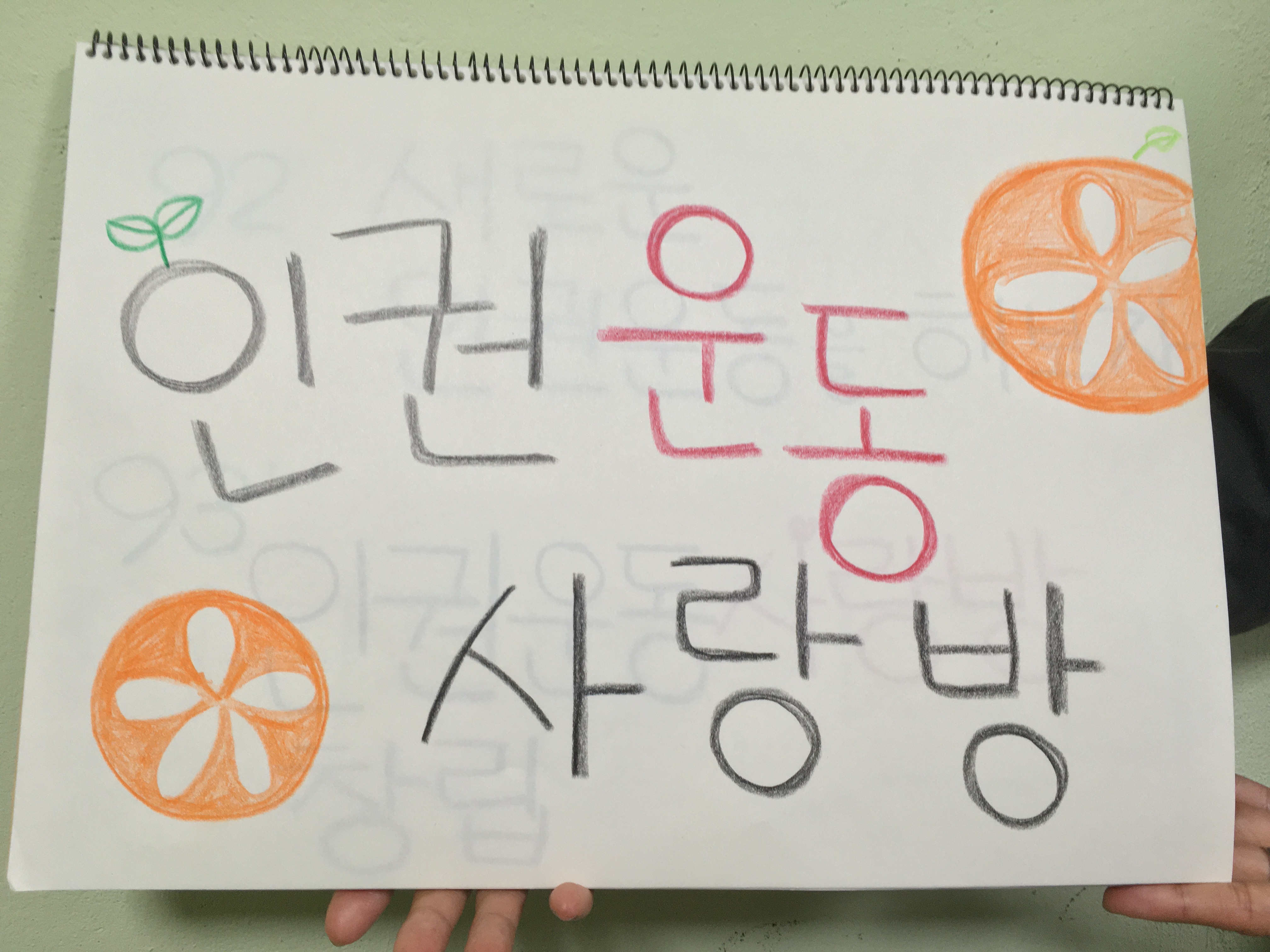“사랑방은 어떤 단체에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자원활동 상담을 할 때 이야기의 시작은 90년대 사랑방이 만들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군가를 돕는 ‘좋은 일’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운동, 그런 새로운 인권운동에 대한 포부로 사랑방이 만들어졌대요.” 그러고는 지난 시간의 굵직한 활동들을 짚은 뒤, 현재 어떤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들어주는 상대가 눈치 챘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마음이 쪼그라들곤 했다. 또렷한 발자국을 남긴 것처럼 보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사랑방은 어떻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사랑방은 어떤 단체에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도 있다. 매달 <사람사랑> 소식지에 실리는 후원인 인터뷰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기회다. 수화기 넘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사랑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깃든 마음을 표현해줄 때, 무언가 비어있던 것이 채워지고 띄엄띄엄 있던 것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활동의 ‘성과’를 뚜렷하게 내보일 게 없는 것 같다는 초라함, 계속 움직이고는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함, 우리의 이야기와 활동이 누구에게 어떻게 가닿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이런 속마음이 가시면서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사랑방의 후원인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 후원인 모집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랑방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럴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떤 불안 같은 게 있었다.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활동으로 90년대와 2000년대가 회자되고 인권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자리에서 과거의 사랑방이 호명될 때, 복잡한 마음이 들곤 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지금의 사랑방은 어떻게 호명되고 회자될지, 설렘보다는 ‘그만큼의 몫을 다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이런 내게 지금 진행 중인 ‘빠듯하지만 뿌듯하게’는 현재의 사랑방을 조금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뿌듯함의 의미를 함께 찾아주고 빠듯함을 같이 나누어주는, 그렇게 우리가 건넨 이야기에 저마다의 자리에서 응답해주는 고마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시 “사랑방은 어떤 단체에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세상 살기 빠듯하지만 그 빠듯함을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누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뿌듯하게 활동하는 곳이라고, 지금의 사랑방 운동과 함께 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건네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