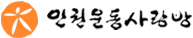▲ <출처; mislataman.blogcindario.com>
보통 우리가 가진 자원들 속에서만 한정지어 생각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나이가 들면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꿈꾸는 경우에도 능력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람들은 보통 집을 구할 때 자신에게 필요하고 깨끗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구하게 된다.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고 그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수입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공간 뿐 아니라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쩌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보고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 혹은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이지 않을까.
얼마 전 한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참가자들에게 1억 원의 돈이 생긴다면,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름대로 행복한 상상을 하고 나서 그 돈으로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 충족이 되는 나의 필요와 욕구들을 찾아보았다. 예를 들어 2년간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했을 때 충족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새로운 자극과 배움 그리고 가능성을 넓히는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영어에 능통해져서 외국의 자료들을 자유롭게 보고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들도 읽고 싶다. 국제회의 등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런 일들을 통해 내가 하는 활동들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나니 딱히 돈을 많이 들여서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어 보인다. 나뿐만이 아니라 참가자들 대부분 그러했다. 오히려 그만한 돈이 필요한 일을 찾기 힘들어했다.
우리가 활동가로 살아가면서 단체를 운영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대부분 한숨에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게 된다.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어서 그 돈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단체의 자생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후원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단체는 후원회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하다가 정작 해야 하는 활동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돈을 끌어 모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몇몇을 가진 단체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민주적이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걸 모두 져버린 단체들은 활동가들이 직접 생계와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고생을 한다.

▲ <출처; www.pegseeger.com>
나의 수입은 대부분 강사료이다. 사교육은 사교육인데 평화를 만드는 소통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더 잘 나누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권리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임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만일 숙박교육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수강료 때문에 망설인다면 대신 교육장에서 청소나 밥을 해주는 것으로 수강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논했었다. 이것이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돈이라는 수단에 가려보이지 않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후원회비로 운영하며 활동가들의 생계는 각자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가들은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사교육에 의존하다보니 입시철이 되면 정기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대안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닐까? 형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말이다.